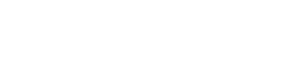녹색칼럼

연한 노란색 몸 옆구리 중앙에 12∼17개의 둥근 갈색 반점이 길게 이어져 있고 몸 길이는 약 7∼8 정도이며, 매우 가늘고 길다. 몸통은 약간 둥글지만 머리 앞 끝은 뾰족하고 꼬리부분은 가늘다. 주둥이 주변에 3쌍의 수염이 있으며, 눈 밑에 움직이는 작은 가시를 공격 무기로 사용한다. 산란기는 5∼6월이다. 1984년 미호천 팔결다리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이래 미호천과 금강일대에 많이 서식했었으나, 골재채취와 하천의 인위적인 변형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멸종위기에 처해왔다. 뒤늦긴했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미호종개. 미호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데다 미호천에 많이 산다고해서 손영목 서원대 명예교수와 김익수 전북대 교수가 이름을 '미호종개'라 붙였다. 우리나라 민물고기 가운데 '종개'라는 이름 붙은 종은 모두 12종이다. 종개과의 대륙종개와 종개가 있고, 미꾸리과가 많은데 그중 참종개속에 속하는 참종개, 부안종개, 미호종개, 왕종개, 남방종개, 동방종개와 기름종개속인 기름종개, 점줄종개, 줄종개, 북방종개가 있다. 하천의 건강성이 종다양성으로 대변되는데, 우리나라 하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민물고기들이다. 이들 물고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호종개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주된 원인은 수질오염, 하상구조의 변화, 어식성어류 증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분포가 워낙 작고, 까다로운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는 미호종개는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직경 0.15∼0.6의 가는 모래가 깔려 있고 유속이 초속 10∼18로 느린 곳에서만 서식한다. 모래를 걸러 그 표면에 붙은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살며, 모래 속에 파고들어 몸을 숨겨야 하기에 고운 모래가 필요하다. 그러나 토사로인해 펄이 덮이면 아가미 호흡을 할 수 없게 되고, 펄에 의해 햇빛이 차단돼 먹이인 조류가 살 수 없기에 결국 굶어 죽게된다. 골재채취로 굵은 모래만 남게 되어도 미호종개는 살 수가 없다. 그렇듯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은 곧 하천의 복원, 맑은 물, 자연성을 회복한 하천, 종다양성이 풍부한 건강한 하천으로의 되살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환경부는 미호종개 종복원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그 연구총괄을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교수팀이 맡고 있는데, 이미 번식에 성공했고, 1만여마리의 미호종개 치어로 키우는데 성공했다. 미호종개 복원지를 찾기 위해 미호천과 금강 수계에 안 다녀본 곳이 없다. 2년간의 조사 끝에 충북 음성 미호천 상류에 미호종개 복원지를 선정했다. 지난 봄 1000여마리의 미호종개 치어를 방사해 서식에 성공했으며 지난달에 추가로 3000여마리를 방사했다. 앞으로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곳 상류에 27홀규모의 대형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1만여마리의 미호종개가 집단 서식하고 있던 백곡천 상류를 잘 돌보지 못해 상류 곳곳의 하천공사로 펄로 뒤덮이게하여 사라져버리게 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한다. 종 복원을 통해 미호천을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허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