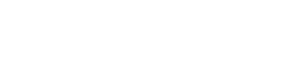아직은 어린 아이인 사내아이들, 미얀마에서는 열살 전후의 남자 어린이에게 성인식을 베푼다.
2500년 전 일국의 왕자였던 석가모니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동네 사원에서 머리를 깎고 단기간의 승려 생활을 하는 것으로 어른이 되는 첫 시작을 경험한다. 한 달에서 길면 여섯 달까지 이어지는 이 수행 생활은 미얀마의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것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미얀마에서 이 의식은 남자로, 참다운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과의례인 셈이다.
통과의례는 사전에 의하면 개인이 새로운 지위·신분·상태를 통과할 때 행하는 의식이나 의례를 말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1909년 반 즈네프갖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후부터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장소·상태·사회적 지위·연령 등의 변화에 따른 의례를 가리키기 위해 이 정의를 사용했다. 사람은 통과의례의 전 과정을 통해 의례적으로 죽고 출생하고 양육되고 단련되며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반 즈네프는 통과의례를 3개의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단계는 통과의례 전의 상태나 지위에 있던 자의 죽음으로 개인의 분리, 격리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종래의 묵은 생활양식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데 정신적으로만 분리되기도 하고 살던 곳으로부터 육체적으로 격리되어 단식, 절식 등 극한 상황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옛 사람은 완전히 죽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단계에서 생(生)에 대한 적응을 위한 준비, 전개 단계로 이 기간 통과의례를 거치는 개인과 사회 속의 다른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예전 지위가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지위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띠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통합을 나타내는 의례를 행하는 과정으로 이 의례를 거치게 되면 개인은 예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관문을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위나 상태를 획득한 사실이 공인되고 문신을 하거나 새로운 머리 모양을 만들거나 반지를 받는 등 그 증표, 상징을 얻게 된다. 미얀마 뿐만 아니라 통과의례 과정에서의 구체적 경험의 양태, 터부, 상징은 다르지만 통과의례라는 의미의 유사한 의식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공유하고 있다.
어김없이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북반구 그것도 4계절이 뚜렷한 지리상 숙명이겠지만 새해를 겨울에 맞는 것은 참 의미 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빛을 잃는다. 초록 잎들은 누렇게 마르고 꽃은 사라진다. 마치 통과의례의 첫 단계를 지나듯 이전과 완전히 격리되어 죽음과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봄부터 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학기가 열리면 통과의례의 두 번째 단계와 같이 우리는 공부, 수업, 변화의 과정을 열심히 살아간다. 그리고 이후 통과의례에 참여했던 우리는 의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다는 징표로 얻은 공인의 상징을 지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 과정은 학생에게나 선생인 나에게나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다. 각자 선생이었던 햇수만큼, 학생이었던 연수만큼 반복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을까? 혹 개선은 못하더라도 개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겨울, 다시 새해 통과의례의 첫 단계에 또다시 발을 들여놓으며 지금까지의 어리석고 부족한 자신으로부터 거듭하는 변화를 또 기약하고 기대해본다.
올 한해도 통과의례의 과정은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겠지만 그래도 해가 떠올랐 듯이 우리의 솟아나는 생명의 힘을 믿고 또 걸어간다. 내년 한층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