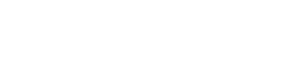데스크의 주장

또 가슴이 철렁.
입영 직전의 아들을 둔 부모들은 이래저래 착잡하다. 만에 하나 내 아들이 군대에서 저런 사고를 당한다면….
엄마들은 더 좌불안석이다. 입영소에서 울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엄마들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혹 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육군 22사단 총기 사고가 발생한 지 16일이 지났다. 사망 5명, 중상 7명의 대형사고다.
특이한 건 사건의 주범이 제대 말년인 병장 계급이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주요 군 총기 사고의 주범들은 대부분 일병, 이병 등 군 생활 적응이 안 된 초년병들이었다.
1994년 경기도 양주 문모 이병 사건(8명 사상), 1996년 강원도 양구군 김모 이병 사건(9명 중경상), 2005년 경기도 연천군 김모 일병 사건(8명 사망) 등. 입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등병, 일등병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이번엔 뜻밖에도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해야 하는(병장이 되어 전역을 앞둔 시점에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는 뜻. 군대에서 쓰는 용어)’ 말년 병장이 끔찍한 사고를 쳤다.
선임들의 가혹 행위나 병영 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초년병들이 저질렀던 사고 유형과는 전혀 딴판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임 병장은 이른바 관심 사병이었다. 2013년 4월 1차 검사에서 GOP(일반 전초) 근무가 불가능한 A급 관심 사병으로 분류됐다.
국군이 발표한 보호 관심 병사 등급 분류 기준을 보면 A급은 자살 우려자 중 계획·시도 경험자, 사고 칠 가능성이 큰 병사가 해당된다. 하지만 그는 7개월 후인 11월에는 B급 판정을 받고 실탄을 소지하는 GOP 근무를 시작했다.
등급이 하향된 이유가 ‘부분대장을 맡겨봤더니 전보다 활달해지고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데 결과는 오판이었다.
관심 사병 보호제는 지난 2005년 경기 연천 총기 사고 발생 후 도입됐다. 실제 성과도 있어 보인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군 부대에서 자살한 사병 10명 중 4명이 관심 사병이었다. ‘요주의’ 인물로 찍어 관심을 두고 살펴본다면 본인의 자살은 물론 임 병장 사례처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처럼 전문의도 아닌 부대장, 소속 상관이 관찰과 면접으로 관심 사병을 분류해내고 등급을 판정해 ‘이상 유무’를 가려내는 건 위험천만이다. 보다 안정적인 사병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나아가 더 생각해봐야 할 건 모병제 확대와 군 병력 감축이다. 첨단 무기로 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현대전에서 정예 강군 육성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해주는 공군 기술병이, 적기의 출현을 감시하는 관제병의 복무 기간이 겨우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써먹을 만’ 하면 전역한다는 얘기다. 장기근속 전문 기술병과 ‘프로페셔널’ 한 부사관이 필요한 이유다.
국방부가 최근 고위험군(群)인 A등급 관심 사병 규모를 45만 장병의 3.8%인 1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모병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이들 ‘시한폭탄’을 왜 정규군에 입대시키는지 모르겠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