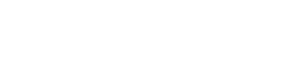김중겸의 안심세상 웰빙치안

범죄자의 구금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그 대표다. 원조는 1679년 인신보호법 Habeas Corpus Act 다. 해이비어스 코퍼스는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는 뜻이다.
You shall have the body 라니 내가 언제는 내몸 갖지 않았었는가. 당연히 내몸 내가 갖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아서 탈이었다. 왕을 비롯한 권력자가 맘대로 투옥했다.
오늘날에야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 물론 악용하는 무리도 있다. 빚 받아내려고 사기로 몰아 고소한다. 왕왕 보고듣는 사례다. 수사기관에서 오라가라 하는 번거로움을 겨냥한다.
암울한 시대에는 고소인이 조사관과 결탁해 구속시키기도 했다. 들어가 앉는게 무서워서 돈 갚겠지 해서다. 예전엔 권력기관이 힘센 이유가 집어넣는 권한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었다.
사람에게 유치시설이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는 익숙한 곳이 아니다. 편안한 내집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반응성 정신장애를 겪는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공통현상이다.
복역으로부터의 탈출원망이 생긴다. 감시상태에 대한 압박감으로 환각과 망상을 경험한다. 병이 든양 가장하는 질병도피도 나타난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객(客)임을 체감해 나간다.
독방이 특히 심하다. 외부자극과 커뮤니케이션의 제한이라는 감각차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급성 정신장애가 초래된다. 감옥폭발이라는 부르는 흥분상태가 고조된다.
구금은 인간사화와의 완전한 절연과 고독을 상상하기 쉽다. 실제로는 일종의 작은 사회다. 특정한 공간과 기간과 위계질서 속에서 벌받는 사람들의 특수사회다. 인간냄새가 농밀하다.
비공식 은어와 관습이 강제된 공동생활을 지배한다. 독서와 기도 등 적응방법을 찾아 기거한다. 교도소화 prisonization 된다. 수형자는 인구 10만명 당 751명인 미국이 제일 많다.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가 뒤를 잇는다. 우리는 97명으로 프랑스와 비슷하다. 관심사는 가족의 안부라 한다.
사형수는 교정과 교화의 대상자가 아니었다. 구치소 미결수 방에서 지냈다. 하루 30분 운동만 허용됐다. 최근 이들을 교도소로 옮겼다. 일도 하고 문화도 접하게 했다. 그래도 사람인데 잘한 일이다. 착하게 삽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