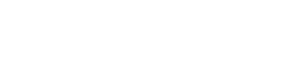충청논단

공자의 제자 증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위대한 스승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제자가 주위를 에워쌌다.
증자가 힘겨운 목소리로 제자들을 주위로 불러 모았다. 증자는 제자들에게 이불을 걷고 자신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다.
뜬금없는 스승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불을 걷고 스승의 몸 이곳저곳을 찬찬히 살폈다.
이윽고 증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은 “내 발을 펴고, 내 손을 펴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매우 두려운 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같이 하라.’고 했다.”
논어(論語) 태백편(太白篇)에 나오는 말이다. 위대한 스승의 유언이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전전긍긍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음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 효의 실천과 삶의 경건함을 몸소 증명하려는 스승의 참됨 가르침을 읽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귀이다.
신체의 터럭과 피부의 상처조차도 불경한 것으로 인식한 효의 근원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살얼음을 걷듯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란 말은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에도 통용된다고 믿고 있다.
행간의 의미는 신체의 존귀함을 보전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이타적인 사고를 함의하고 있다.
몸에 상처가 없다는 것은 부모를 위한 효의 시작이며, 살얼음 걷듯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것은 삶의 궁극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배척보다는 포용과 인내를 동반하는 구도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생명은 ‘내 것’이라는 소아적인 발상을 넘어 사회적관계라는 의미로 확대됨을 증자의 유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충북에서 ‘동반자살’, 특히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거두는 불행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매일 40여 명의 사람이 자살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자녀와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죽는 사람에게 이유를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지만, 대부분이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른들처럼 삶이 버겁다는 의식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부모 없이 모진 세파(世波)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부모의 예단이 부른 왜곡된 문화다. 이런 현상을 놓고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현상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죽음을 강요당하는 아이들이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성공확률도 높다.
또한, 부자(父子) 동반 자살보다 모자(母子) 자살률인 높다는 것은 모성애가 집착으로 이어진 불행한 현상이다.
태어남엔 이유가 없지만, 죽음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다.
신병을 비관한 부부의 동반자살,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 연인의 동반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동반자살, 화덕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이 과거에 많다면 이젠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자살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 삶이 아름답다는 등, 자살을 극복한 미담을 통해 생존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약육강식처럼 돼버린 사회적 난폭성과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나뉘는 사회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은 지극히 상대적인 문제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한계점을 지난 우리 사회에서 자살률 증가와 동반자살과 같은 병리적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놓다.
그런데 문제는 동반자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극빈층과 실업자에 대한 공적인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가족해체 시 가족보호의 책임을 사회가 맡는 방법도 모색되어야한다.
무엇보다 자녀를 동반한 자살은 ‘분명한 타살’이라는 사회적인식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