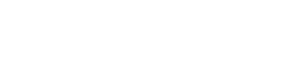데스크의 주장

장량에 필적했던 유방의 참모는 병법의 달인인 한신(韓信)이다. 장량과 달리 유방의 작읍을 받아 초왕(楚王)으로 군림하며 권력을 누렸지만 말년은 비참했다. 모반 혐의를 뒤집어 쓴 그는 '토사구팽'을 되뇌이며 처형당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逐鹿者 不見山)는 말이 있다. 중국 남송시대 한 선승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눈앞의 사슴만 쫓다가는 산중에 파묻혀 길을 잃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하찮은 명예와 욕망에 집착하다 보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명석함을 잃게 된다는 얘기도 된다.
항우라는 사슴을 쫓아 숲속 깊이 들어갔던 장량은 사슴을 잡고나서는 자신에게 드리워질 새로운 환경(숲)을 헤아렸을 것이다. 대륙의 주인으로 성장한 유방이 계속 보필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그릇의 크기를 저울질했을 수도 있을 테고, 앞으로는 전장이 아니라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판 속에서 입지를 세워나가야 할 자신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를 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추구해야 할 것이 없는 인생의 최정점에 올랐다는 결론을 내리고 은퇴를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역사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옳은 것이 된다. 반면 한신은 명예와 권력을 계속 추구하다 유방의 경계를 샀고 결국 형장에서 최후를 맞았다.
장량의 고사가 떠오른 것은 누군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며 자리를 내놨다거나, 썩은 세상을 일갈한 후 홀연히 초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근자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결과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도 희희낙락하는 낯두꺼운 모습들이 갈수록 늘어나니 '박수 칠 때' 떠난 장량의 혜안이 우러러 보일 뿐이다.
보궐선거에서 한 자리도 건지지 못하고 대패한 정당에서 부끄러워하는 패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궤변으로 결과를 왜곡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필부만도 못한 군상들만 보일 뿐이다. 기껏 내놓은 '친박계 기용'이라는 내부 수습책이 오히려 분란을 부추겨 반대의 결과를 낳았는데도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사람은 없다.
정치판이야 그렇다 치고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어온 신영철 대법관의 행보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신의 행위를 부적절했다고 결론짓고 법원공무원노조가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후배판사들의 충정까지 외면하는 것이다. 대법관은 판사들이 동경하고 지향하는 자리로 권력보다 명예가 빛나는 자리이다. 그는 법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그 자체에 책임을 졌어야 했다. 시기를 놓치면 용퇴의 결단도 쫓겨나는 모양새가 된다. 이미 실기한 대법관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사슴을 쫓는 사람과 관련해 다른 고사도 있다. 축록자 불고토(逐鹿者 不顧兎)라는 말이다. 사슴을 잡으려는 사람이 하찮은 토끼에 신경써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작은 일에 얽매이다 보면 큰일을 망친다는 뜻이다. 명분없이 자리에 집착하는 것도 사슴은 물론 끝까지 챙기려던 토끼마저 놓치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