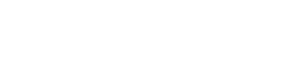무심천

지금 농촌에 모를 낸다. 전처럼 논에 일꾼을 가득 얻어 세우고 참참이 술이다 새참이다 점심이다 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시대가 발전하여 선진화된 덕이다. 그저 술이라야 소주 한두 병, 새참으로 자장면, 점심은 음식점에 시키면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 세상 좋아질 대로 좋아진 것이다.
예전 농촌 여인네들 일도 많았다. 반면 남자들 큰일 다 하는 듯해도 사실은 별로였다. 소를 다루고 지게로 저 나르는 일, 등 왕일만 대충대충 하면 큰일이나 한 것처럼 알아주니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들이 그렇다. 모를 깁는 일, 모를 날라 주는 일정도 하면 된다. 이제는 여자가 대충 대충이다. 모 내는 날이라 해도 이앙기 운전기사, 모를 대주는 사람, 더러 빈자리가 생길까 모를 깁는 사람 등이다. 대농이라 할지라도 사람 대 여섯 사람 왔다 갔다 할 뿐, 모심는 날이라고 해야 옛날 축제처럼 다루는 연중행사가 아니다.
옛날 촌부하면 일 부자였다. 대농지기 농촌갑부라 해도 숙명처럼 겪어야 하는 모내기, 논매기, 피사리, 물대고 빼기, 베기, 드리기, 타작하기 등, 들판 가득 사람들로 북적이는 일거리 천지다. 그러고도 도정공장을 거처야 쌀이 된다. 농사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도 많다. 부농은 수확의 기쁨을 간직하여 어려움 정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일 천국에서의 얻음이란 기쁨과 고통의 반타작이다. 그러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일에 진저리를 내고, 그를 잊기 위해 술로서 견디어 갔으며 기회만 있으면 농촌을 떠나려 했다.
그 때 나도 농촌의 현실 속에 있었다. 어느 해 지루하기만 한 봄날, 한 달여 동안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저히 술 힘이 아니고는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부터 부잣집 일을 갔다. 한참을 일했는데도 참이 늦게 서야 술이 나왔다. 한 아저씨가 나가서 술맛을 보더니, 머리를 흔들며 "아- 셔 썩은 보리술이야"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일꾼들마다 하는 소리 "역시 또 신 술이구먼. 부잣집 썩었다. 복 받기는 글렀다." 하며 술을 한 사람도 입에 대지 않았다. 가끔 처음 술맛을 봤던 아저씨만 "시거나 말거나 내나 한잔 해야겠군" 하며 한잔 씩 얼굴을 찡그리며 마시곤 했다. 그는 술이 달거나 시거나 술로 사는 전형적인 농군이었다. 일꾼들은 봄내 지친 몸이었으니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다.
점심도 늦게야 나왔다. 술 주전자를 들어본 주인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흔들며 "왜 술들을 남겼어요." 하자 누군가가 "셔-서 한사람도 입에 안댔어요." "뭐요. 무슨 말이 예요. 시다니요. 벼도 좋고 해서 용수 밖아 짠-건데" 어느 아저씨가 그 술맛을 보니 그것은 기가 막힌 동동주가 아닌가. 사실을 눈치챈 일꾼들은 술맛을 봤던 아저씨를 싱겁게 바라보며 속았음을 박장대소했다. 그제야 허리를 제치며 웃어 제치는 아저씨였다. 평소 이집은 다른 일을 할 때 여러 번, 신 보리술을 내온 사실이 있다. 그러니 까마게 속을 수밖에. 맛있는 술을 혼자 마시며 웃기던 이야기. 힘든 일터에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웃자한 일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